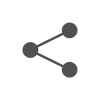새벽 5시. 인력시장에 가려고 일찌감치 일어나 아침밥을 챙겨먹고 집을 나섰다. 신발, 장갑, 각대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서 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채 지하철에 몸을 싣는다.
이른 시간이라 한두 명만 앉아있을 뿐 좌석은 텅 비어 있다. 앉아 있는 그 두어 명은 나처럼 무슨 볼일이 있어 나온 것이 아니라면 어젯밤을 하얗게 보내고 이제야 집으로 가는 중일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 지하철은 ‘유성온천역’에 도착하였다. 나는 개찰구를 빠져나와 빠른 걸음으로 유성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걸음을 재촉한다.
인력시장에 모인 사람들은 아침 여섯시쯤이면 절반가량이 지정된 공사장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부르는 공사장으로 나가기 위해 대기한다. 한쪽에서는 아직 일을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며 자기가 다녔던 공사장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도 근처에 앉아 담배 하나 입에 물고서 그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때 인력사무소 사장이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기 시작한다. 나의 이름도 들어 있다. 이때만큼은 나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장이 좋아진다.
다섯 사람이 한조가 되어 조장의 자가용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삼천 원을 건넨다. 교통비를 이렇게 주는 것이 이곳의 관례이다. 아직도 이른 아침이라 거리는 텅 비어있다.
나 같은 잡부는 기술자가 아니어서 일당이 그리 많지 않다. 하루 십이만 원 정도를 받는데 용돈벌이로는 나쁘지 않아 간간이 인력시장에 나오곤 한다.
공사현장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으니 너나 나나 똑같은 공사장 잡부로 보인다. 옷을 갈아입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공사장에서 나는 흙냄새며 나무와 시멘트 냄새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공사장에서만 맡을 수 있는 이 냄새는 언제 맡아도 정이 들지 않는다. 담배 한 대 입에 물고 작업지시를 기다리는데 담배를 다 피워갈 때쯤 반장이 와서 우리를 이리저리 갈라놓는다.
공사장으로 나올 때마다 사람이 좋아 보이는지 안 좋아 보이는지 하루 일진을 살피듯이 반장의 얼굴을 살핀다. 2톤 화물차로 자재를 나르고 쌓는 일을 하란다. 그나마 오늘은 어려운 일이 없을 것 같다. 한번은 목수 뒷모도를 하고서 오랫동안 고생했던 적이 있었다.
그 후로는 되도록이면 힘든 일을 피하려고 요령을 부렸는데 용하게도 잘 피해 다니는 편이다. 몸이 재산이니 어쩔 수 없다. ‘돈 벌려다가 병원비가 더 나온다.’는 말은 이 세계에서는 명언으로 통한다. 일당으로만 따져 한 달 꼬박 일을 하면 제법 돈이 되는 것 같지만 20일 이상 일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곳이 여기이다.
아홉시 반이면 간식시간이다. 빵 한 개와 우유 한 개를 먹고 담배 두 대를 피우면 다시 일을 시작한다. 어떨 때는 심장이 쪼그라들 정도로 위험한 순간도 있다. 공사장 곳곳이 워낙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아차하면 사고가 일어난다. 모든 것은 그날의 운이고 작업자의 조심성에 달려있다. 정신없이 일하다보면 시간이 열한시 오십분이 된다.
“자, 점심 먹으러 갑시다. 한시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그 순간 인력시장에서 나온 작업자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진다. “이제 집에 갈 준비나 합시다.”하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서로 웃는데 모두들 하얀 이만 보이고 얼굴 전체가 검둥이가 되어 있다.
점심밥은 잘 나온다. 음식이 원래 맛있었겠지만 일을 하고 난 뒤라 맛이 더욱 기가 막힌다. 식후에는 합판을 주워 그늘에 깔아놓고 드러눕는다. 그때 하늘을 보면 진짜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러다 어느새 구름 속으로 들어가 잠이 든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저절로 눈이 떠지는데 어디선가 “일 합시다. 여기 자러 왔어요?”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다시 옷을 추스르고 현장으로 향한다. 물론 입에는 담배가 물려 있다.
오후는 오전에 비해 시간이 빨리 간다. 일이 일곱 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은 오후가 오전보다 짧다. 그리고 오후는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오전보다는 한결 수월하다. 어떤 날은 오후에 시간만 때우다 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공사장은 점심 먹으면 집에 갈 준비나 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럭저럭 오후를 보내고 나면 긴장되는 순간이 온다. 그 시간은 네시 삼십분에서 다섯시 사이다. 보통 다섯시에 일을 마치는데 우리는 삼십분 전부터 마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네시 반이면 조장은 벌써 일을 끝내고 와서 “김씨, 뭐해 집에 가야지”하고는 우리를 쳐다본다. 그러면 반장은 “아직 시간이 멀었어요. 다섯시까진데.”한다.
그렇게 서로 기싸움을 하다가 보통 반반씩 양보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속칭 삽자루를 던지는 싸움이 나기 일쑤이다. 그렇게 하루를 때웠다. 나는 ‘다시 오면 내가 이름을 간다’는 넋두리를 입 밖으로 내뱉으며 조장 차에 몸을 싣는다.
“그래, 보람찬 하루였어.” 순간 인력사무소 사장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생긴다. 일당은 인력시장 사장에게서 받기 때문이다. “차는 왜 이리 느려?” 안달을 하며 도착하니 사장이 있다. 사장을 보니 그리 반가울 수가 없다. 그렇게 돈은 내 호주머니로 들어왔다. ‘다시 보지 맙시다.’
좋아할 아내의 얼굴이 떠오른다. “오늘 나 십이만 원 벌었어.” 그날 인력시장의 노동은 그렇게 끝났다. 하하하
- 노총각의 죽음과 카메라 - 2021-08-29
- 아파도 너무 아팠던 족저근막염 치료 후기 - 2019-10-29
- 어머니 도시락 - 2018-09-16
덕구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링크하는 조건으로 기사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 및 각색 후 (재)배포는 금합니다. 아래 공유버튼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