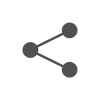비가 오면 나는 잠을 많이 자는 편이다. 기압차 때문일 수도 있지만 빗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를 유난히 좋아하는 나에게는 비는 꿀잠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물론 어린 시절에는 잠보다 집 뒤에 있는 대전역 철도 운동장에서 온몸으로 빗줄기를 가르면서 뛰어놀기를 좋아했는데, 그 덕분에 감기에 걸려 고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해 여름, 대전역 철도운동장 땅을 고른다고 불도저가 땅을 파헤쳤는데 나는 그곳에서 잠자리도 잡고 메뚜기며 방아깨비를 잡는 놀이에 시간이 지나가는 줄 모르고 지냈다. 그러다 비가 오면 빗속을 달리며 온몸으로 비를 맞으며 뛰어놀곤 하였다. 고무신에 스며드는 빗물은 따스했지만 어머니는 항상 비만 오면 나에게 감기 조심하라시며 걱정해주셨다.
그 당시 우리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기름칠한 양철지붕을 한 집이 많았다. 내가 살던 집도 마찬가지였다. 비가 오는 날이면 후두둑~ 후두둑~ 하는 빗소리에 잠겨 하루를 꼬박 자는 경우도 많았다.
철도운동장과 우리 동네 집들 사이에는 경계를 가르는 담이 쳐져있었는데 그 담장이 우리에게 또 다른 재미를 불러 일으켜주었다. 담장을 돌로 쳐 구멍을 내어 잡고 올라가거나 그 담장위에서 뛰어놀곤 하였다. 그래서 동네어른들은 우리 꼬맹이들을 다람쥐라고 불렀다. 그렇게 놀다가 저녁 무렵 어머니들의 식사를 알리는 소리에 집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봄에는 봄의 경치가 있고, 여름에는 여름의 경치가있고, 가을은 가을의 경치가 있고, 또 겨울에는 겨울의 경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철도 운동장이었다. 지금에서야보면 더럽기 그지없지만 그곳은 우리꼬맹이들의 낙원 이었다.
겨울, 함박눈이 내리면 동생과 함께 운동장에 나가 눈사람을 만드느라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 함박눈이 내리는 밤에 전봇대의 가로등이 켜져 있고, 연탄재들이 수북이 쌓여있는, 그 담장 너머에서 나와 동생은 함박눈이 내리는 어둠속에서 눈덩이를 굴려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세상은 온통 눈 속에 갇혀있고, 내리는 함박눈 속에서 나와 동생의 눈사람은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눈이 온 다음날에는 친구들과 구공탄 덩어리와 눈을 가지고 던지며 놀다보면 어느새 저녁은 다가오고, 이 동네 저 동네 누비며 친구들과 폭음탄 하나씩 들고 남의 집 대문에 매달고 초인종 누르기, 지나가는 누나 핸드백에 던지기를 하다보면 어른들과 누나들의 “저놈들 잡아라” 소리에 도망을 치곤하였다. 도망을 가면서도 우리의 웃음소리는 끊어지지 않았다.
저녁이면 운동장에 모여 깡통에 구멍을 뚫어 철사로 깡통을 매달고 불붙은 나무를 넣고 윙윙 돌리다 불꽃이 깡통에 싸일 때 공중으로 휙 던지면 하늘로 불덩이가 올라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머리를 감싸고 “불 떨어진다” 소리 지르며 피하곤 하였다. 땅따먹기, 오징어 잡기, 담방구, 딱지놀이, 구슬치기 이런 놀이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장소를 제공하는 철도 운동장.
지금 어른이 돼서야, 그 철도 운동장이 나의 천국이었음,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음을, 어린 시절 가난한 담장너머 철도 운동장에 행복이 있었음을 깨닫는다.
지금은 아무도 놀지 않는 곳. 그곳에 가서 서있으면 행복이 희미한 기억의 건너편에서 항상 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때의 불도저·비·메뚜기·방아깨비 그리고 함박눈과 연탄재와 깡통과 폭음탄은 어른이 된 지금도 나의 마음속에 철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서 나를 그곳, 어린 시절로 보내곤 한다.
- 노총각의 죽음과 카메라 - 2021-08-29
- 아파도 너무 아팠던 족저근막염 치료 후기 - 2019-10-29
- 어머니 도시락 - 2018-09-16
덕구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링크하는 조건으로 기사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 및 각색 후 (재)배포는 금합니다. 아래 공유버튼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