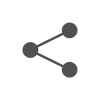6년 전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돌담을 쌓고 그 위에 자산홍, 영산홍, 백철쭉 같은 철쭉과 황금측백나무를 고루 심었다. 사계절 푸른 황금측백나무로 눈을 맑게 하고 봄이면 화사하게 피는 철쭉의 아름다움을 즐겨볼까 해서 시작한 일이었다.
좋아하는 황금측백나무는 27그루나 심었는데 이 황금측백나무가 까닭 없이 비실비실 말라가는 것이었다. 돌보는 정성이 부족하였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상해진 기후 탓인 것 같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렇게 잘 내리던 눈도 통 내리지 않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봄 가뭄마저 심했기 때문이다.
딴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물을 주느라 애썼는데 아무런 보람도 없이 12그루만 남기고 모두 죽어버렸다. 그때의 실망감이란······.
남은 측백나무마저 잃을 새라 온갖 정성을 다해 돌봤더니 키가 1.5미터쯤 되었을 때는 보는 사람마다 멋지다고 한마디씩 할 정도로 잘 자랐다. 그랬던 황금측백나무인데, 어느 겨울 모진 한파를 이기지 못하고 돌 틈에서 태어난 아기측백과 어른 측백나무 한그루를 제외하곤 모조리 죽어버리고 말았다. 어쩌면 그렇게 허무하게 밤새 모두 죽어버렸는지.
한동안 실의에 빠져 있다가 이듬해 뒷산에 올라가 소나무를 감고 있는 토종 담쟁이넝쿨을 몇 뿌리 뽑아다 돌담 아래에 심었다.
소나무 담쟁이넝쿨이 10년 이상 자라면 ‘송담’이라는 귀한 약재가 된다지만, 그까지 바라지는 않고 그저 담쟁이넝쿨이 돌담과 어우러져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만 바랐을 뿐이다.
“담쟁아, 넌 측백이처럼 허무하게 죽지 말고 무럭무럭 자라렴.”
우려와 달리 담쟁이넝쿨은 잘 자랐다. 잘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 자라 3년이 지나자 지붕 위까지 점령하려고 했다. 이러다 집 전체가 담쟁이넝쿨로 덮여버릴 것 같아 겁이 났다.
그때부터 틈만 나면 전지가위로 쳐내기 시작했다. 잘 자라라고 속삭일 때는 언제고 너무 자랐다고 잘라내는 모습이라니.
매년 잘라주는데도 바쁜 여름이 지나면 주위가 온통 담쟁이넝쿨로 감겨져 있다. 난간에 걸쳐진 모습이 멋지게 보일 때도 있지만 그때를 제외하면 제멋대로 자라는 넝쿨이 무찔러야 할 적군으로 보일 때가 더 많다.
이젠 유리창도 담쟁이넝쿨에게 점령당했다. 그나마 유리창에 늘어진 모습은 나름 분위기가 있어 쳐내지 않고 그대로 두고 보고 있다.
정성을 다해 키운 황금측백나무는 보람도 없이 죽어버렸는데, 담쟁이넝쿨은 심기만 하고 내버려 둬도 잘만 자란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땐 주어진 사명이 다 끝난 것이라던데 나무도 사람처럼 주어진 사명이라도 있어야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일까?
다시 가을이다. 시간이 흐르니 담쟁이가 잎도 더 커지고 붉게 단풍이 들었다. 자연의 섭리에 따른다지만 어쩌면 이리도 곱게 물들었을까.
이 가을이 가고 겨울도 가면 다시 일전을 벌여야 할 테지만, 고운 자태로 나에게도 사명이 있다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것만 같은 단풍이 지금은 사랑스럽기만 하다.
덕구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링크하는 조건으로 기사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 및 각색 후 (재)배포는 금합니다. 아래 공유버튼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