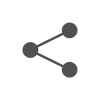비가 오는 날. 이런 날은 운전조심 하지 않으면 사고 나기 십상이다. 내가 27살이었을 때 모 여대 앞에서 카페 하는 사촌누님으로부터 5일간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이 와서 친구 세 명과 그 카페에서 먹고 자며 일을 한 적이 있었다.
그날은 무던히도 더운 여름날이었다. 저녁에 카페손님을 치르고 우리는 카페에서 잠을 청했다. 나는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산책이나 할 요량으로 새벽 네 시에 밖으로 나왔다.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고 있었다. 밤사이 날씨가 변해 소나기가 내리는 모양이었다. 나는 우산을 펴들고 비가 내리는 새벽거리를 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내 눈앞에 보이는 어느 여인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신발을 손에 들고 우산도 없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이었다. 컴컴한 새벽 속에서 검은 바탕의 윗옷을 입은 그녀가 비에 젖어 흘러내려온 머릿결로 내 눈을 휘감고 들어왔다. 나는 순간 그녀에게 매료되어버렸다. 나는 왠지 모를 끌림에 그녀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아가씨,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제 우산을 쓰시죠.”
말을 건네며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상당히 예쁜 아가씨였다. 가녀린 몸매에 비에 젖은 긴 머리는 흡사 선녀가 비 오는 날 지상에 내려와서 세상구경을 하는 것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켰다.
“아니요, 비 맞는 게 좋아요.”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우산을 나도 모르게 접었다. 그리고 신을 벗어 손으로 쥐었다. 온몸이 비에 젖어 들어가면서 순간 내가 미쳤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이미 저지른 나의 행동을 막을 수가 없었다.
맨발에 소나기를 온몸으로 받으면서 말도 없이 그저 그녀가 가는대로 따라 걸었다. 그녀에게는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다. 말을 거는 순간 하늘로 올라가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코로 그리고 내 다문 입술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저 그녀가 가는대로 옆에서 따라 걸을 뿐. 그렇게 한참을 걸었다. 얼마인지도 모를 시간이 흘러갔다. 어느 골목까지 가서야 그녀는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바로 앞이 집이에요”
나는 그녀를 놓아줄 수 없다는 절박함에 “커피라도 한잔”하고 말을 건네며 그녀의 눈과 입 그리고 맨발을 응시하였다. 그녀의 몸을 타고 흐르는 물결의 폭포수.
“미안해요”
그녀는 발걸음을 돌려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하늘에서 온 선녀는 그렇게 내 곁을 떠난 것이다. 오늘 내리는 비는 차갑다. 그날의 비는 참 따스했는데.
- 노총각의 죽음과 카메라 - 2021-08-29
- 아파도 너무 아팠던 족저근막염 치료 후기 - 2019-10-29
- 어머니 도시락 - 2018-09-16
덕구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링크하는 조건으로 기사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 및 각색 후 (재)배포는 금합니다. 아래 공유버튼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