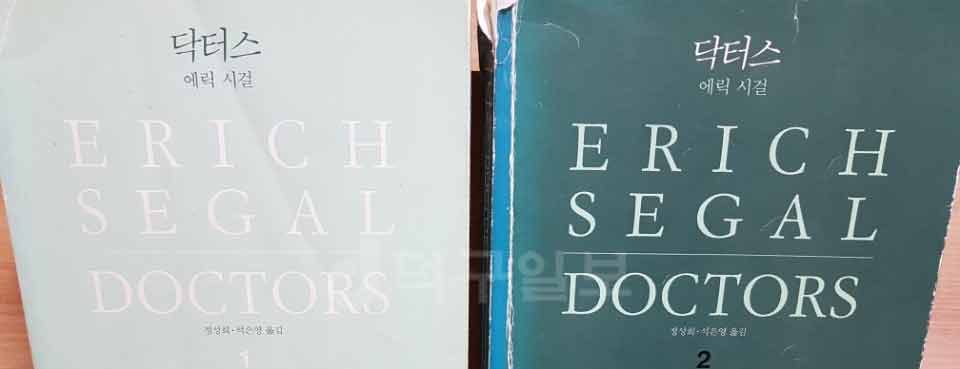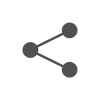숱하게 서평을 쓰면서도 에릭 시걸(Erich Segal)의 닥터스(Doctors)는 한 번도 취급하지 않은 것 같다. ‘존엄사’나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관한 글을 쓰면 습관적으로 ‘닥터스’의 내용을 인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꼭 서평을 쓴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까닭이다.
서평이라고 해봐야 출간한지 오래된 중고서적 위주인지라 문제될 것은 없지만, 소장하고 있는 책이 1판 13쇄로 1990년 7월에 발행된 것으로 소유기간만 28년째인데 너무 무심했다. 늦었지만 아끼는 책 ‘닥터스’에 대한 서평 몇 자 적어본다.
나는 에릭 시걸의 대표작이 닥터스라고··· 생각한다. 간혹 ‘러브 스토리‘를 꼽는 이들이 있어서 닥터스가 에릭 시걸의 대표작이라 고집은 못하겠다. 그만큼 둘 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사랑 받았던 작품이다. 나는 에릭 시걸 하면 닥터스가 먼저 생각나던데, 러브 스토리가 먼저 떠오른다면 뭐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닥터스면 어떻고 러브 스토리면 어떻겠나. 작품만 좋으면 됐지.
에릭 시걸의 다른 작품을 읽지 않은 독자라면 일단 닥터스를 쓴 에릭 시걸이 닥터가 아니란 점은 알아둬야 할 것 같다. 당시 에릭 시걸은 하버드 문학교수였다. 의학소설의 거장이라 일컬어지는 로빈 쿡이 닥터이고, 법정소설의 대가라는 존 그리샴이 변호사 출신인 점을 생각하면 의외이다. 그만큼 닥터스는 닥터가 아니면 모를 닥터들의 세계를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에릭 시걸은 “이 작품을 쓰는 동안 ‘닥터 시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수없이 병원 복도를 어슬렁거렸다”라고 작가후기에 남겼는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을지 책을 읽어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역시 좋은 작품은 충분한 준비에서 나오는 법이다.
김영사에서 펴낸 ‘닥터스’는 1, 2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다. 주인공 바니 리빙스톤과 로라 카스텔라노가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끄는 큰 축이고, 곁가지로 이들의 하버드 의대 친구들인 벤넷 랜스먼과 모리 에스트먼 그리고 세드 라자루스에 관한 이야기가 제법 비중 있게 담겨있다.
이들 중 벤넷 랜스먼과 세드 라자루스에 관한 부분은 유의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벤넷 랜스먼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관한 에피소드에 등장하고, 세드 라자루스는 ‘안락사’에 관한 부분에서 주역이다. 닥터스에서 나의 눈길을 끈 몇몇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바니 리빙스톤은 묘한 매력을 풍기는 인물이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바니는 엄마에게는 믿음직한 아들이고, 동생에게는 친구 같은 형이다. 모나지 않는 성격에 자상한 면이 있어 친구들 사이에 신망이 두텁다.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엄친아인데 이러한 캐릭터가 에릭 시걸의 유려한 필치에 잘 녹아있다.
로라 카스텔라노는 바니의 소울메이트이다. 닥터스는 “바니 리빙스톤은 로라 카스텔라노의 알몸을 본 브루클린 최초의 소년이 되었다.”로 시작되는데, 이 한 문장으로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로라 카스텔라노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페인계인데 에릭 시걸은 로라를 뛰어난 외모를 가진 재원으로 묘사하고 있다. 국내가요 중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라는 노랫말을 가진 곡이 있는데, 바니와 로라가 딱 그런 사이이다.
벤넷 랜스먼은 닥터스의 주요인물로 바니의 절친 중 절친이다. 흑인인 벤넷이 등장함으로서 흑인인권문제가 살짝 조명되기도 하지만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수혜자가 되는(?) 부분이 눈길을 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생부와 유대인 의부를 둔 벤넷 랜스먼은 닥터스에서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
세드 라자루스는 닥터스에서 가장 나의 눈길을 끌었던 인물이다. 닥터스에서는 시대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여러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안락사’에 관한 부분이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니 당연히 존엄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바는 아니로되 이야기가 안락사로 넘어가면 좀 상황이 복잡해진다. 범죄와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많은 공간을 활용하여 세드 라자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스포일러(spoiler)가 될까하여 생략한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세드 라자루스와 같은 의사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지만 이성의 한쪽에서는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오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닥터스의 시대적 배경이 1960년대라는 점도 유념해야할 부분이다. 뉴 프런티어의 기수 존 F.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그리고 쿠바의 붉은 별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 등이 활동했던 시기가 1960년대이다. 격동의 시절, 하버드 의대생들의 치열한 수련과 사랑과 우정을 담아 놓은 작품이 닥터스이다.
웬만한 독서가들이라면 읽지 않았을까 생각해보지만 혹여 읽지 않았다면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시대적 배경이 맞지 않는 것은 별반 문제가 아니지 싶다. 그런 것 따지면 역사물은 못 읽는다. 닥터스가 역사물은 아니지만 그만한 가치는 있다. 나는 문학적 수준이 무지 높은 작품보다 이렇게 통속적인 것이 좋더라.
- 듕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면 - 2021-09-25
- 작품성이 엿보였던 영화 자산어보 - 2021-09-24
- 병원에서 죽는다는 것 - 2021-09-12
덕구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링크하는 조건으로 기사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 및 각색 후 (재)배포는 금합니다. 아래 공유버튼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