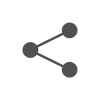며칠 전, 이웃집에 신이 산다라는 영화를 우연히 보고 끄적끄적 몇 자 적었다. 흥미로운 주제였지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아쉬웠다는 것이 요지였다. 정통 판타지가 아닌 다음에야 신(神)과 인간의 만남이 흥미롭지 않을 수 없는데 생각할수록 아까운 주제였다.
요나스 요나손의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과 같이 외국의 코믹스러운 책들을 국내에 들여오는데 일가견이 있는 ‘열린책들’이 2015년 출간한 책 가운데 ‘실패한 심리치료사’와 ‘불행한 신’의 미묘한 동행을 그린 작품이 있다.
독일 작가 한스 라트(Hans Rath)의 ‘그리고 신은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Und Gott sprach: Wir müssen reden!)라는 작품이다. ‘이웃집에 신이 산다’라는 영화를 생각하니 영화와 제목이 비슷한 이 책이 떠올랐다.
‘그리고 신은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는 독일에서 1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로 ‘신’이 심리치료사를 찾아와 상담을 의뢰한다는 황당하면서도 심각한 주제를 담고 있는 소설이다.
담겨있는 내용은 다르지만 신과 인간의 접촉이라는 면에서는 두 작품은 공통점이 있다. 이웃집에 사는 신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고약한 신’이지만, 얘기나 좀 하자는 신은 고민이 많은 ‘인간적인 신’이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 심리 치료사 야콥과 자칭 ‘신’ 아벨에게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 야콥은 이혼과 파산으로 자기 문제도 감당하기 벅찬 상태라 손님도 없는 심리 치료사 일을 접을까 고려 중이다. 아벨은 아르바이트로 서커스 광대 일을 하는데 ‘신’답지 않게 고민이 많다.
야콥은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아벨을 정신이상자로 간주하면서도 왠지 모를 호감을 느끼고 상담 의뢰를 받아들인다. 아벨이 말하는 전과는 화려하기 그지없다. 의사, 비행사, 판사, 건축가…. 아벨은 사칭한 것이 아니라 모두 면허가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빅뱅’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남자의 말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동행이 계속될수록 마냥 정신이상자로만 보기 어려운 아벨의 예사롭지 않은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신이 없더라도 우리는 신을 만들어 냈을 것이다.”
천지창조를 마친 다음 날, 신은 어디로 가야 했을까? 감당할 수 없는 골칫거리를 만들어 냈음을 깨닫고 혹시 심리 상담소를 찾아가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신은 얘기나 좀 하자고 말하지 않았을까? 한스 라트는 그런 상상을 오늘의 현실 속에 옮겨 놓고 있다.
신과 심리치료사가 만나 처음 한 일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는 것이었다. 웃음 나는 사건들과 예측 불허의 스토리 전개, ‘신’과 치료사의 대화 속에 진지한 질문들이 모습을 바꾸고 숨어 있다.
진짜 신이 우리 옆에 있다면 우리는 그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가 어떤 증명을 해보여야 우리는 그가 신이라는 사실을 믿을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세상의 모습은 어떨까? 모두에게 더 나은 세상이 되었을까, 그 반대일까?
인용된 “신이 없더라도 우리는 신을 만들어 냈을 것이다”라는 볼테르의 말은 작품의 주제를 잘 함축하고 있다. 작품을 다 읽고 나면 더욱 와닿는 명제다. 신의 존재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어떻게든 신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떤 신을 필요로 할까? 이 작품을 우리말로 옮긴 역자는 말한다. “이렇게 익살맞고 능청스러운 신이 있다면 이 고달픈 삶도 그렇게 외롭진 않을 것이다.”
소설책이 지나치게 진지하거나 어려우면 독자들에게 외면받는다. 소설이 학습서와 다른 것은 쉽게 읽힌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신은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는 괜찮은 책이다. 삶이 건조하고 재미없다고 느껴질 때 읽으면 좋다.
- 듕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면 - 2021-09-25
- 작품성이 엿보였던 영화 자산어보 - 2021-09-24
- 병원에서 죽는다는 것 - 2021-09-12
덕구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링크하는 조건으로 기사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 및 각색 후 (재)배포는 금합니다. 아래 공유버튼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