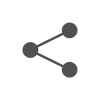예전만은 못하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그리고 교사 등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선망하는 직업입니다. 그 외에도 교수 과학자 작가 등 비‘사’자 직업도 마찬가지인데, 모두 전문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렇다면 조선시대는 어떨까요? 그 시절에도 의사나 변호사 같은 직업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요즘처럼 선망의 대상이었을까요? 한의사들을 의사라는 범주에 포함되니 분명 예전에도 의사는 있었던 셈인데 변호사와 같은 법률가들도 있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소설가를 매설가로 불렀습니다. 양반전, 허생전 등을 지었던 연암 박지원이 대표적인 매설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탁환의 ‘서러워라 잊혀진다는 것은’과 “방각본 살인사건”을 통해 매설가라는 말이 널리 알려졌지요.
역사학자이거나 역사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들 제외한 일반인들은 대중을 상대로 출판된 책들을 통하거나 TV나 영화와 같은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학교 역사 선생님인 민병덕 작가의 “옛날에도 변호사가 있었나요?”라는 책을 통해 ‘고용대송’이라는 말이 알려졌지만 독자층이 청소년이라 그 대강의 뜻만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의 깊이를 떠나 이렇게 출판물이나 대중성이 있는 매체를 통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정보전달이 용이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이자 소재인 ‘외지부(外知部)’는 2016년 MBC에서 방영하였던 드라마 ‘옥중화’를 통해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외지부란 무엇인가?
외지부를 제대로 알려면 약간의 역사적 배경지식이 필요합니다. 조선시대 행정의 골격은 이·호·예·병·형·공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눠집니다. 즉,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 이렇게 여섯 개 부서로 나눠지고 그 수장을 판서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의 장관에 해당하지요. 이는 지방에도 그대로 이어져 이방·호방·예방·병방·형방·공방이 됩니다. 그 외에도 승정원, 사헌부, 사간원, 포도청 정도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관청이 있는데 그 중에 장예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장예원은 노비에 관한 장부와 문서 그리고 소송사무를 관장하던 정삼품아문입니다. 변정원이 뒤에 이름을 바꾸어 정예원이 된 것이지요.
시대를 약간 거슬러 올라 고려시대로 가면 ‘도관지부(都官知部)’라는 관청이 나오는데, 이 관청이 조선시대에 노비변정도감이 되었다가 뒤에 형조도감→ 변정원→ 장예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장예원의 전신이 도관지부입니다.
외지부는 이 도관지부에서 나온 말입니다. ‘도관’은 노비 장부와 소송을 담당하는 관청을 이르는 말이고, 지부는 지부사(知部事)를 뜻하는 형부 소속의 종3품 관직명입니다. 그러니까 지부사가 도관으로 파견되어 노비 소송을 판결하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장예원에서 노비 소송 업무를 담당한 형부관리를 도관지부라고 한다면, 외지부는 도관 밖에서 지부사 행세를 하는 사람을 속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부사가 아닌데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관의 밖에서 소송에 관여하고 소송을 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외지부라 부르는 것입니다.
앞서 조선시대 고용대송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용대송이란 사건의 당사자를 도와 소송을 대신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송인이라고 하는데 외지부가 대송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대송인이나 외지부가 하는 일이 소장(소지) 을 대신 작성해주거나 법률자문을 통해 소송에서 이기도록 하는 일인데 대가를 받고 한다는 점에서 보면 오늘날의 변호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지부의 폐단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유명한 격언도 있거니와 법이 있다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분쟁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비리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외지부의 경우에도 세간으로부터 소송을 부추기거나 법률 조문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시비를 바꾸고 어지럽힌다는 비난을 받았고, 그 결과 성종9년 외지부의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외지부로 활동을 하다가 발각될 경우 본인을 비롯하여 가족까지 모두 변방으로 쫓김을 당하는 법을 받았고, 이런 외지부를 신고하고 잡아온 사람은 면포 50필을 상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성종9년을 기점으로 외지부가 없어졌을까요? 선조실록에 외지부가 존재하였음을 알려주는 단서가 실려 있습니다. 선조36년 사헌부에서 조정립이라는 관리를 탄핵하면서 “비리 호송하는 외지부로 평생의 사업을 삼은 자”라고 지목한 것입니다.
또 숙종 시절 한위겸이라는 중인이 비리호송을 업으로 삼으면서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여 거래하다가 발각된 사례가 있었고, 영조9년 ‘강조이’라는 과부가 소지(소장)를 진주목사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문서의 격식이나 문장이 하층민 여성이 작성하였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여 외지부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였습니다.
외지부의 신분은 ‘중인계급’
조선시대는 사농공상의 엄격함이 살아있는 계급사회입니다. 양반, 중인, 평민, 천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부는 관리로 있던 ‘조정립’을 제하면 한위겸의 사례처럼 율과출신의 중인계급의 사람들이 업으로 삼는 직종이었습니다.
의원들 역시 중인계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위 조정립처럼 양반이면서 의원인 ‘유의’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들 의원들이 관원이 되어 의업을 펼치려면 국가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양반들의 시험인 ‘과거’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취재’라고 불렀습니다.
외지부의 바깥외(外)라는 글자로 유추해보면 지부가 아닌 사람을 뜻하므로 결국 권력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쟁송을 일삼는 자’, ‘소송을 교사하는 자’라며 비난을 받았다는 기록을 보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신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는 모든 거래나 소송이 모두 문서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벌이만큼은 괜찮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듕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면 - 2021-09-25
- 작품성이 엿보였던 영화 자산어보 - 2021-09-24
- 병원에서 죽는다는 것 - 2021-09-12
덕구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링크하는 조건으로 기사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 및 각색 후 (재)배포는 금합니다. 아래 공유버튼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