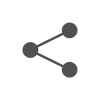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이 왔다. 한여름 무더위를 겪을 때, 밭으로 가는 길에 있는 대추와 밤송이가 조금씩 굵어지는 것에 가을을 느끼며 적잖은 위로를 얻곤 했다.
알밤을 줍기 위한 만반의 채비를 했다. 밀짚모자를 쓰고, 장화를 신었다. 이십 년 전 밭둑에 심은 밤나무 세 그루는, 나에게 있어서 가을의 풍성함을 만끽할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하다.
해마다 알밤을 주울 때면 늘 궁금증이 생기곤 한다. ‘왜 밤톨은 꼭 세 개일까?’ 쭉정이까지 합하면 예외 없이 모두가 세 개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밤톨 세 개가 토실하게 들어있으면 무척 반갑고 기분이 좋다. 단순히 개수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니다. 문득 우리 삼 형제가 생각나기 때문이다.
우리 집안은 삼 형제로 내가 맏이이다. 아들만 있는 집안은 대개 분위기가 썰렁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우애 있게 지냈다. 이젠 커서 다들 가정을 이루고, 두 동생은 직장 따라 객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크고 작은 문제들, 어머니의 큰 수술과 재산 문제들을 겪는 동안 삼 형제는 때론 다투고 화해하기를 반복했다. 그래서인지 알밤을 주울 때마다 포근한 밤송이 속처럼, 오손도손 지내던 옛 시절이 그립다.
밤나무에 가까이 다가가니, 지난번 비바람 때문에 밤송이들이 여기저기 많이 떨어져 있었다. 비록 밤송이는 커도 한 톨만 들어있는 것이 많다. 어떤 것은 실한 밤톨이 쭉정이에 둘러싸여 있고, 어떤 것은 쭉정이를 업고 있는 모양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다르듯이 밤송이 안도 각기 다르다. 형제들이 똑같이 잘 되기 어렵고, 가정마다 행복의 정도도 다르기 마련이다.
연신 밤송이를 까고 줍다가 토실한 세 톨이 들어있는 밤송이를 또 만났다. 마음이 좋아진다. 어렸을 적 삼 형제가 함께 놀던 한 장면이 떠오른다. 바로 이곳, 이곳에서 눈 내린 겨울날 비료포대로 미끄럼을 탔던 곳이다. 두 시간을 계속하는 동안 세 톨 밤송이를 볼 때마다 또 다른 추억이 떠오른다.
어머니는 삼 형제를 낳고 키우며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까? 어릴 적 내 모습이 ‘깎아놓은 밤’ 같았다고 하신 말씀처럼, 첫 딸의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라 감격했다.
두터운 가시 옷을 입은 밤송이처럼, 어머니의 삶도 그러하셨다. 가시 박힌 손으로 집안 살림을 일으키면서 가시 같은 힘든 세월을 보내셨다. 땅바닥에 떨어져 말라가는 밤송이들, 제 몸을 찢어 굵은 알밤을 토해낸 자욱들도 점차 스러져간다.
떨어진 밤톨을 찾기 위해 낫으로 묵은 밤송이들이 섞여있는 낙엽을 긁었을 때, 놀랍게도 지렁이들이 튀어나왔다. 이런 곳에서도 지렁이가 살고 있다니! 그들에겐 날카로운 가시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일도 별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였다. 가시 끝이 무뎌져 썩기를 기다리고, 그 척박한 터전을 일구어 살아가는 지렁이가 새삼 대단해 보였다.
어쩌면 우리도 가시 돋친 사람들 사이에서 눈과 혀에 가시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비록 힘들지라도 지렁이처럼 연약한 맨살로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며 용기를 얻는다.
밤을 다 줍고서 포대를 어깨에 메니 너무 무겁다. 다시 동생들 얼굴이 떠오른다. 이다음에 오면 후숙이 되어 그 맛은 더 깊고 맛있어지겠지.
- 최도현의 전원일기(8) 알밤을 주우며 - 2021-09-26
- 최도현의 전원일기(7) 세종시 로컬푸드 싱싱장터의 초보 장사꾼 - 2021-09-08
-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 죽음과 죽어감에 관한 실질적 조언 - 2021-08-16
덕구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링크하는 조건으로 기사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 및 각색 후 (재)배포는 금합니다. 아래 공유버튼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