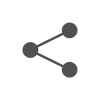피터 스완슨의 ‘죽여 마땅한 사람들’을 다시 읽었다. 작년 여름 처음 읽었을 때 그다지 좋은 느낌을 받지 못한 탓에 그냥 노트에만 짧게 ‘시시함’이라고 코멘트를 해뒀던 책이다. 그런데 다시 꺼내든 것은 순전히 제목 때문이다.
세상엔 ‘죽어 마땅한 사람’은 있어도 ‘죽여 마땅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니 없어야 하고 없는 것이 정상이다. 한 끗 차이지만 이 문장에서 ‘어’와 ‘여’에는 ‘바람’과 ‘실행’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미운 놈 죽기를 바랄 수는 있으나 죽일 수는 없는 건데, 피터 스완슨의 소설엔 ‘죽여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달려있다. 어쩌면 이 제목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내 마음 어느 한구석에 ‘죽여 마땅한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아~ 무서웡~
존재함으로 해로운 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이 책은 그런 사람을 ‘죽여 마땅한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좀 더 공격적으로 바꿨다. 세상에 이롭진 않더라도 해롭진 않은 사람이 되어야할 텐데 나부터가 비싼 쌀만 축내고 있으니 할 말이 없다.
피터 스완슨의 ‘죽여 마땅한 사람들’은 어른이 읽어야 하는 책이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어른만 읽어야하는 소설이다. 지금은 개화되어 성(性)에 개방적이지만 예전 기준이라면 출판이 어려웠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적판에나 나올 정도로 묘사가 자극적이지는 않다. 정말 애매할 정도의 성적 묘사가 담겨 있다. 그래도 애들은 읽으면 안 된다. 저리 가라~
죽여 마땅한 사람들은 테드, 릴리, 미란다, 킴볼 이렇게 각각 다른 네 명의 화자(話者)가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과거와 현재가 섞여 있어 정신 사납다. 1, 2부까지는 이런 설정이 괜찮았으나 뒤로 갈수록 그런 생각이 심하게 들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를 반대로 하면 이 작품 ‘죽여 마땅한 사람들’이 된다. 도입부부터 전개까지는 책에서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재미있었지만 뒤로 갈수록 시시뽕뽕한 것이 괜히 전체적인 설정까지 거슬린다.
서양 사람들의 성문화를 엿보는 즐거움 빼고는 그리 흥미로운 요소를 발견할 수 없어 주제적인 면으로는 차라리 일전에 소개한 국내소설 김서진의 ‘선량한 시민’이 훨씬 나아 보인다. 읽었는데 좋았다면 다행이지만, 공짜로 빌려보는 것은 몰라도 돈 주고 구입할만한 책이 아니란 것이 나의 판단이다.
- 듕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면 - 2021-09-25
- 작품성이 엿보였던 영화 자산어보 - 2021-09-24
- 병원에서 죽는다는 것 - 2021-09-12
덕구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링크하는 조건으로 기사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 및 각색 후 (재)배포는 금합니다. 아래 공유버튼을 이용하세요.